|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 도올
- 복잡계
- opinion dynamics
- data science
- 우석훈
- 매체환경
- 인터넷
- 행위자 기반 모형
- TEDMED
- 데이터 사이언스
- data-driven social science
- 평형상태
- 학제간 연구
- 알갱이성
- 사회적원자
- 액설로드
- 학문
- computational social science
- mathematical model
- 적응적 행위자
- 산불 모형
- 바라바시
- 소셜 시뮬레이션
- 빅데이터
- 네트워크
- 사회운동
- 모듈성
- 집단행동
- 수학적 모델링
- 나는 꼼수다
- Today
- Total
목록내 공부 (35)
단순한 인간, 복잡한 사회
[우석훈의 시민운동 몇 어찌](34) ‘나꼼수’ 김어준이 진짜 무서운 이유 위 칼럼을 보고 느낀 점 1) 새삼스럽지만, 우석훈씨는 말발보다는 글발이 더 좋은 것 같다. 2) '프레임 전쟁'이라는 것이 언론학에서도 꽤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다(아직도 프레임 타령만 하는 사람도 많다). 그 다음이 뭔지에 대해 좀 깜깜했었는데, 우석훈씨의 '스타일'이라는 것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복잡계와의 관련성도 그 '스타일'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3) 나도 옛날 스타일인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주변 자연환경이 어떠한지에 따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달라질 것이다. 거친 바다와 싸우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바다가 친구이자 두려움이기 때문에, 기술이나 세계관이 바다의 작동 방식에 맞춰 발달해 왔을 것이다. 사막, 극지방, 산악 지대 등도 비슷할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도구(미디어)를 쓰는지에 따라 사고방식이나 사고체계가 달라진다는 마샬 맥루한(Marshal McLuhan)의 이야기도 떠올릴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소위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어떤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그것을 "게임적 세계관"이라 부르고 싶다. 여러 디지털 미디어(또는 서비스)중에서 굳이 게임인 이유는, 따지고보면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
"그러나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연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조사를 통해 한 가지와 다른 한 가지 사이의 ‘상관 관계’를 찾는다. 예를 들어 빈곤과 범죄율, 교육과 소득 사이의 상관 관계를 찾는다. 연결 고리를 찾으면, 그들은 하나가 다른 것을 ‘설명’했다고 말한다. 왜 도심 지역의 범죄율이 높은가? 간단하다. 도심의 빈곤이 심하기 때문이고, 두 가지는 같이 간다. 여기에는 잘못이 없고, 두 사건의 상관 관계 또는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뭔가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연구는 대개 여기에서 끝나 버린다. 사람들의 활동이 왜 그런 패턴을 만드는지 자세히 탐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인과의 메커니즘을 살펴보지 않는다. 빈곤은 개인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빈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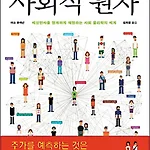 사회적 원자(2010)
사회적 원자(2010)
마크 뷰캐넌 지음, 김희봉 옮김 (2010). "사회적 원자". 사이언스북스. 마크 뷰캐넌이란 사람은 '네이쳐'지의 편집장을 역임할 정도로 자연과학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인 모양이다. 당연히 나는 그의 책을 읽기 전까지는 몰랐다 --; 그런데 나에게 마크 뷰캐넌은 대단한 충격을 준 사람으로 기억된다. 그의 다른 책이었던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하다"(원제 : Ubiquity)를 읽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바라바시의 "링크"(원제 : Linked)를 읽고 대단한 흥미가 생겨서 인터넷 서점에서 그와 비슷하다고 추천한 책들을 마구 읽어댔던 시절이 있었다. 적지 않은 내용이 비슷해서 흥미가 있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을 때 만났던 책이 마크 뷰캐넌의 책들이었다. 특히 "세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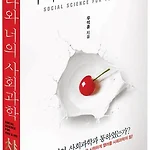 나와 너의 사회과학(2011)
나와 너의 사회과학(2011)
우석훈 지음 (2011). "나와 너의 사회과학". 김영사. 영화를 보러 나갔다가 시간이 남아 들른 서점 진열대에서 눈에 띈 책이다. 신문에서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래저래 바빠서 사 볼 생각은 못 하고 있다가 눈에 보인 김에 충동구매(?) 했다. 표지에 나오는 '사회과학 방법론 강의'라는 말에 눈이 갔다. 사실 석사때와 박사 코스웤때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체 학문이란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저널 심사 결과표를 보면 뭐가 어떻다 저쩧다 말이 많은데, 대체 뭘 기준으로 좋은 논문과 좋지 않은 논문을 판단한단 말인가. 그런 고민 속에서 소위 사회과학 방법론이라는 것을 몇 학기동안 공부했었다. 결국 철학적인 문제였던 것 같다. 과학이 무엇이고(또는 무엇이어야 하..
